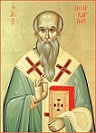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조용한 시간이면 변호사 수첩을 뒤적인다. 평생 사용해 온 수첩 속은 악취 나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다. 의뢰인들의 분노와 증오, 세상에 대한 원망, 거짓말 합리화가 켜켜이 층을 이루며 쌓여있다. 그런 속에서 금싸라기 같은 한마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불의 정화를 이겨내고 남은 반짝이는 순금 같은 말이다. 수첩 사이에 이렇게 한마디가 메모되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예수가 오천 명의 배고픈 사람을 먹인 것 같이 변호사가 자기가 벌어서 오천 명을 먹일 수 있다면 그런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이웃의 법률사무소를 하는 칠십 대 오 변호사가 무심코 내게 던졌던 한 마디다. 그 말이 나의 가슴 속 강물에 동그란 파문을 일으켰었나 보다. 오 변호사는 아내와 오래된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다. 판사와 교수로 평생을 학같이 살아온 분이다. 그들 부부와 종종 건물 지하의 작은 밥집에서 소박한 음식을 나눈다. 인심 좋은 여주인이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국을 파는 백반집이다. 그의 심부름을 하느라고 눈 내리던 겨울밤 한 번 고생을 한 적이 있다. 암을 앓던 시인이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죽어가는 걸 보고 변협신문에 작은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그 글을 본 선배 오 변호사는 내게 이백만 원을 보내면서 시인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성경 속의 자캐오(삭개오)처럼 번 돈을 내놓겠다는 분이다. 그 돈은 외로운 시인에게 겨울밤 구들목 같은 따뜻한 사랑이었다. 살다 보면 들꽃 같은 그런 작은 사랑들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다. 금년에 또 하나 심부름을 한 일이 있다. 지난해 아흔 살인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쯤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 아들인 내가 할 작은 일들까지 자상하게 챙기며 지시했다. 영정사진은 어떤 걸 쓰고 초상이 끝난 후 문상객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라고까지 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이런 말을 했다. “칠십 년 전 시집와서 살 때 골목길 앞집 꼬마가 생각나. 맨 날 보면서 정이 들었어. 한번 만나 맛있는 것 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어. 엄마가 죽은 다음에 네가 대신 찾아가 맛있는 걸 사주던가 밥값을 전해 줘.” 어머니의 독특한 부탁이었다. 일 년 만에 꼬마였었다는 그분을 만났다. 이미 칠십대 말의 노인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말을 전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인 돈이 든 봉투를 전했다. 노인은 어쩔 줄을 몰랐다. “뒷집 아주머니는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었어요. 내가 낮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혼자 있던 다섯 살 아들이 담장 위에서 놀다가 녹슨 쇠꼬챙이에 손바닥이 뚫려 매달려 있었어요. 그걸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피 흘리는 아이를 엎고 동네의원까지 가서 살려주셨죠. 내가 오십 먹은 아들 보고 지금까지 넌 뒷집 아주머니가 아니면 죽었을 거야라고 해요.” 어머니에게 앞집 꼬마였던 그 노인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나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영혼의 강물 속에 잔잔한 파동이 일어나 점차 퍼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전한 작은 돈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사랑이었다. 엄상익|변호사, 크리스찬리뷰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