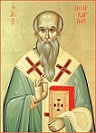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직업적인 법무장교로 군에서 오 년간 지낸 적이 있었다. 사회에서 처음 상관으로 만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의 뇌리에 동영상처럼 찍혔다.
서울법대를 나온 그는 장군이 되고 싶은 갈망이 큰 것 같았다. 평상시에도 말을 그렇게 하고 계룡산에 있는 점쟁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미 보병 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제대를 했다. 그런데 군에 장교로 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장군이었다. 그 시절 나는 그 반대의 심정이었다.
군대에 가기 싫어 병역 연기를 거듭하다가 거꾸로 장기 직업 장교라는 구덩이에 처박힌 느낌이었다.
나는 수시로 탈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을 하고 계엄령이 내리자 상관이었던 그에게 기회가 왔다. 그는 군사법원의 검사직을 맡은 장교로서 김재규와 체포된 김대중 그리고 재야인사들을 기소했다.
권력과 직접 선이 닿는 출세의 기회를 잡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소원대로 장군이 됐다. 그 무렵 나는 군대에서 나와 변호사를 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5공 청산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계엄 당시 김대중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하고 군사재판을 했던 사실들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인간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같다. 변호사를 하던 나는 어느 날 우연히 대통령 직속 기관의 비정규직 품꾼으로 들어가게 됐다. 내가 받은 임무 중의 하나가 청문회의 답변을 준비하는 육군본부 군법회의에 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진실한 평가보고서를 써서 상부에 올리라는 내용이었다. 명령권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당신은 대통령이나 안전기획부장을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그곳의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말고 중심을 잡고 보고서를 쓰시오”
그게 대통령 직속 기구의 힘인 것 같다. 대통령의 평범한 비서관이 육군 대장을 개인적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것은 그런 배경인 것 같았다. 내게 명령을 내리는 권력자는 또 이런 말을 했다.
“그 장군은 계엄 군법회의 시절 정권에서 신세를 진 사람이오. 장관까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공천을 주거나 병무청장 같은 자리 정도 고려하고 있소.”
나는 명령을 받고 육군본부 법무감실로 갔었다. 장군이었던 그가 계엄시절 수사와 재판에 동원됐던 사람들의 팀장이 되어 청문회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뒤에서 조용히 그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나를 보고 불편했던지 이런 말을 내뱉었다.
“자네는 지금 직급이 뭔가? 사무관인가? 서기관쯤 되나?” 그의 눈에서는 과거 인연을 맺었던 따뜻한 정이 전혀 흐르지 않았다. 계급이나 지위로 나를 깔아뭉갤 수 있는지를 가늠할 뿐이었다.
나도 정이 없었다. 군 생활을 할 때 상관이던 그에게 여러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의 맹목적인 출세주의에 대한 역겨움 비슷한 반감도 숨어 있었다. 그 얼마 후 텔레비전으로 중개되는 청문회에서 그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묵사발이 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 후 그는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섰다. 그러나 떨어졌다. 그가 또 다시 출마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 선거를 치르느라고 그의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갔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듣기도 했다.
어느 날 그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신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가 병원에서 죽어 쓸쓸하게 화장터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후배 장교들 그 누구도 몰랐던 외로운 죽음이었다고 했다. 그와의 짧은 인연을 돌이켜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한 가지 잣대만 가진 외눈박이 인간들은 자신의 사다리가 올바른 벽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보다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이 올라왔느냐만 따진다.
이십대 말 내가 가장 춥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는 냉정하게 잡아달라는 내 손을 뿌리쳤었다. 자신의 장군 진급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도 얼음이 되어 있었다.
지금은 후회가 된다. 그가 살았을 때 허름한 식당이라도 같이 가서 밥을 사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을. 나는 너무 옹졸한 인간이었다.〠
엄상익|변호사, 본지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