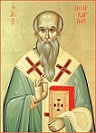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반포천을 따라 만든 산책로를 가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의 자그마한 동상을 본 적이 있다. 수필가 피천득 씨의 모습이었다. 같이 산책을 하던 동네 친구인 노인이 그 동상을 보면서 말했다.
“저 양반 살아있을 때 종종 이 동네에서 봤어요. 자그마하고 말이 없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치가나 군인뿐만이 아니라 수필가를 기념해 주는 넉넉한 사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메모해 둔 적이 있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한 세기를 살았어. 인간이 사는데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중요한데 막상 살아보니까 평생 먹은 양이 얼마 안돼. 또 검소하게 지내면 옷값도 별로 안 들어. 작은 돈이라도 넉넉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런데 왜들 아귀다툼하고 사는 지 몰라. 나는 먹는 양이 아주 작아 그렇게 소식(小食)을 하니까 이렇게 오래 사나 봐.”
그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그의 살아있는 철학은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명주실 같았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감상하잖아? 그 아름다움을 뇌리에 기억해 둘 수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림의 주인이야. 굳이 누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 아무 때나 보고 싶으면 미술관에 가서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볼 줄 모르고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소유욕에 불과하지 진짜 주인은 아니야. 나는 가진 건 없어도 아주 부자라고 생각해.”
그는 자기가 평생 써 오던 글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나이를 먹으니까 더 좋은 작품이 씌어지지 않아. 글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예전 글의 반복이거나 늘여먹는 꼴 밖에 안돼. 더 좋은 글을 쓸 수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죽음도 그래. 이제는 언제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지만 재촉은 안해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워.”
젊은 시절 진리의 말들을 들어도 나는 혼자서 캄캄한 밤을 걸어가고 있었다. 더러운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진리가 스며들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혼은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피천득 씨 같은 분들의 수필은 내 어두운 영혼에 은은히 비치는 달빛이었다.
청빈하게 살다가 간 그 수필가의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 칠십 고개에 오른 나의 삶을 돌이켜 본다. 돈이 없어 굶어 죽을까 걱정하던 내가 평생 쓴 돈은 얼마나 될까.
오십 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내게 바닷가 바위에 붙은 따개비를 연상하는 판잣집들의 기억을 남겨놓았다. 반들반들하게 닦은 양철 쟁반 위에 놓인 밥과 강된장 그리고 김치국을 먹고 자랐다.
미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 옷들을 입고 자랐다. 이름 모를 미국 소년이 입다 버린 바지나 셔츠들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쓴 교육비 영수증을 이십 년이 넘는 세월 비닐봉지에 차곡차곡 보관해 두었다. 대학 때 은행대출을 얻어서 낸 한학기 등록금이 칠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제일 많이 쓴 교육비였다.
중고등학교시절까지 합쳐도 얼마 되지 않았다. 함경도 회령에서 월남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는 내게 어떤 거친 곳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
같은 회령 출신 유명한 희극배우 김희갑 씨의 얘기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 그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극장 무대 밑 공간에서 잠을 자고 극단에서 밥을 얻어먹었다고 했다.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는 것이다.
일생 돈의 노예가 되어 캄캄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일찍부터 자각하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강물이 흘러도 두더지는 그 작은 배 하나 채울 정도면 되고 숲이 울창해도 새가 쉴 곳은 나뭇가지 하나면 되니까. 내게는 버릇같이 인색했지만 가난하지는 않았다. 많은 여행을 했다. 더러 주제넘은 기부도 해봤다. 나는 쓴 만큼 벌었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파도치는 동해의 바닷가에서 잘 살고 있다. 내가 존경하는 현자 노인은 백오십 년 전 쓴 그의 글을 통해 내게 이렇게 말한다.
“슬픈 때는 가난한 때도 버림받은 때도 세상이 외로워지는 때도 남에게 조롱받는 때도 아니오. 슬픈 때는 내 마음의 눈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때지. 그때야말로 내 곳간이 넘쳐 있어도 내게 기쁨이 없지. 마음을 깨끗이 하시오. 특히 자신의 가치를 알아 겸손하시오.”〠
엄상익 변호사, 본지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