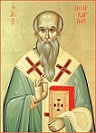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고은 씨가 지은 시 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 꽃”이 있다. 짧지만 터치가 깊고 여운이 길다.
「내려갈 때/보았네/올라갈 때/보지 못한/그 꽃」 살아가다 보면 삶이 허걱지걱 할 때가 많다. 질서도 없이 밀려드는 일상에 나를 맡기다 보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자연스레 미로에 갇힌 인생이 되기 십상이다. 모두가 숨이 차 오를 만큼 바쁘다. 바쁜 삶에 타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으로 치부된다. “나는 요즘 바빠!” 하는 말에는 “나 요즘 잘 나가!”하는 자만심이 묻어난다. 오죽 못났으면 한가하게 살고 있느냐고 핀잔을 받는 사회 분위기다. 그래서 누군가 전화를 하면 몹시 바쁜 듯, 괜히 숨을 몰아 쉬며 받는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몇 년 전 뉴질랜드 남섬의 만년설이 덮힌 마운트 쿡 아래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멀리서 볼 때 눈앞에 펼쳐진 그 산은 조금만 노력하면 나에게도 잡힐 듯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이었을뿐 현실은 일반인들이 도전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곳이었다. 높은 정상은 아무나 넘볼 수 있는 만만한 언덕과는 다르다. 나중에서야 몇명의 등산객들이 조난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산의 실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만 보면 안달을 한다. 정상 정복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정복으로 얻을 수 있는 쾌감은 분명히 유혹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일이다. 높을 곳일수록 위험수위는 증폭된다. 에베레스트 8000미터 이상의 등정은 여가활동과는 다르다. 눈덮인 가파른 능선을 타고 오를 때는 단 1m도 만만하지 않다고 한다. 최고조의 긴장을 놓을 수 없다. 한순간에 마치 블랙홀로 빠지듯 증발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앞만 보고 산다. 뒤를 돌아 볼 여유도 없다. 여유를 가지는 날에는 다른 이가 먼저 깃대를 꽂을 것 같다. 내가 그곳에 도달하지 않으면 천길 벼랑에 떨어질 것 처럼 여긴다. 모두가 비장하다. 결국 하나에만 고정된 사시가 된다. 한가지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다. 하나 때문에 수없는 것을 놓치는 비운을 맛본다. 내려올 때 본 꽃은 오를 때 그곳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 적이 없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거부하기 힘든 꽃의 향기, 아름다운 자태, 바람에 하늘거리는 그 꽃의 흔들림에서 오는 감성적 풍요로움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낙엽이 귀찮아 불에 태워버리는 동안에 가을의 정취는 질식을 당한다. 아이들의 성가신 행동들에 치여 어서 빨리 크기만을 바랄 때 아이들이 비벼대는 스킨쉽이 주는 행복은 놓쳐버린다.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나물반찬에 뒤섞인 농부의 땀과 들녘의 바람을 느낄 정서가 남아있지 않다. 과정이 생략된 잔인한 목적주의, 불확실한 미래에 현재 주어진 작은 행복이 매몰되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G20을 주도할 정도로 조국은 쉴 새 없이 경제성장이라는 높은 산을 향해 올라왔다. 우리가 얻은 것은 경제적 부요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놓쳐버린 것들이 더 많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고 행복지수는 방글라데시보다도 낮다고 한다. 결국 정복에 눈 먼 등정의 과정에 조난객들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 그랬다. 정상에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내가 찾던 것이 없었다고… 그렇다. 정상은 한 사람이 서기에도 비좁다. 비바람이 몰아칠 뿐 의외로 시계는 좁다. 안개와 구름이 뒤섞인 그곳은 매우 춥고 외로운 곳이다. 오를 때 놓친 것은 꽃이 아니라 삶 자체다. 힘겨운 사투로 밟고 지나간 꽃을 다시 살려내는 일, 그것이 삶 다운 삶의 재현이 되리라. 이규현|시드니새순장로교회 담임목사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