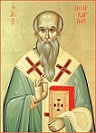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풍요의 문화 속에 사는 현대인은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고,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쌓아놓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가득 채워진 냉장고의 깊은 곳은 천연의 깊은 동굴 안과도 같다. 부엌의 주인마저 미로의 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영양 과다로 생긴 체중을 줄이는 일은 수도사의 고행의 길처럼 멀고도 험난하다. 피트니스 클럽,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살 빼기와의 전쟁을 치루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진 노역의 현장이다.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어 들르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이템들로 마치 우리를 천국 비슷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강렬하게 유혹한다.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언의 심리적 압력에 밀려 자신도 모르게 장 바구니를 가득 채우게 된다. 사람들은 채우는 것에 익숙하다. 자신의 몸마저 겨우 가누는 노숙인이 카트 위에 어마어마한 짐들을 쌓아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심지어는 카트 두개를 끌고 다니는 이를 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과연 그가 알고나 있는 것일까? 그 짐들 때문에 한 걸음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그만의 일일까? 모두 무엇인가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나중에는 쌓은 것이 나의 짐이 되어 삶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된다. 이사를 하게 되면 묵은 짐들을 정리하게 된다. 그때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살았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전혀 쓸모없는 것, 조금 도움이 되긴 하나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이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다 끌어안고 산다. 내가 소유한 것인가, 아니면 소유에 소유를 당한 것인가? 괴테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가졌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움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데 버린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 비움을 상실로 여기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로 채우려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앙칼진 독수리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다. 존재론적 불안이다. 그 불안은 나도 모르게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움켜 쥐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채움은 만족이 아니라 목을 더 마르게 한다.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면 막힘 현상이 생긴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썩는다. 늘 포만감을 원하는 배는 질병을 부르게 되듯이… 비움의 훈련은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금식과 침묵은 비움의 훈련을 위해 거쳐야할 과제다. 금식과 침묵의 시간들은 욕망으로 부풀어 오른 허영들, 쓸데없는 염려들,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폭식증 환자처럼 무조건 집어삼키는 만성적 허기증을 치료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 침묵은 생각 속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화를 위해 묵상을 불러오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금식 훈련은 채움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오래된 기름진 때를 벗겨내는데 매우 유익하다. 꽉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굶주린 야수와 같은 내면 세계를 극복하지 않은 한 인간의 삶은 무겁고 힘든 여정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밖에 없다. 채움의 광기에서 비움의 영성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결국 존재의 부요함,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터득해야만 가능하다.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손에 쥐어진, 아니 마음의 한구석에 미련을 떨쳐 버리지 못한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부터 새로운 삶은 출발할 수 있다. 나의 삶을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버림으로 나의 삶을 가볍게만 할 수 있다면 언젠가 새의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으로 날아오르는 자유인이 되리라.〠 이규현 시드니새순장로교회 담임목사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