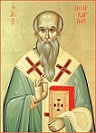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아무리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 간다. 몸으로 가지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간다. 왜 우리는 기를 쓰고 고향에 가는 것일까. 거기가 그리움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헤르만 헤세는 ‘그리움이야말로 낯선 곳을 방랑하는 자신을 살아 숨 쉬도록 만드는 궁극의 실재’라고 표현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움을 간직하며 그리움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를 역임했던 이희돈 장로가 지난 9월 3일 62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다. 2001년 9·11테러 당시 비행기 테러를 당한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이후 전 세계 한인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했다. 이 장로가 위암으로 별세한 이후 SNS의 추모 영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보면 하나같이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이 장로에게 한없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이 장로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용기를 얻은 사람, 소명을 새롭게 한 사람 등 모든 이들이 이 장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이 장로는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 장로 추모영상 댓글을 보며 참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킨 그리움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그리워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이 장로뿐 아니라 ‘그 청년 바보 의사’로 불린 안수현, 믿음의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 나치에 대항했던 독일의 본회퍼 목사 등, 이 땅을 떠났지만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들이 생전에 이뤘던 업적 때문이 아니다. 그들 삶에 순백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국 보는 것은 그들이 지녔던 명함의 앞면이 아니라 명함의 뒷면이다.
그들은 참된 헌신과 사랑, 믿음, 따뜻함, 인간다움 등을 보여줬다. 그것들은 명함의 앞면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에 생명을 던졌다.
지금 우리가 상실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리움이다. 특별히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고향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리움의 사람들이었다. 소박하고 가난했지만 생명의 온기가 남아 있던 그 교회를 우리는 그리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자건 비신자건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보면 본능적으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그를 이웃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움 가득 찬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움이 사라진 교회라니, 너무나 허전하지 않은가.
분명 그리움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리움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그리움은 작동한다. 아니 그리움은 인공지능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세상이 펼쳐질수록 그리움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리움은 인간의 최후 무기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한국교회가 그리움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무엇보다 이 땅을 넘어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움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태형|현 기록문화연구소 소장, 고려대 사학과 및 미국 풀러신학대학원(MDiv) 졸업, 국민일보 도쿄특파원,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소장 역임.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