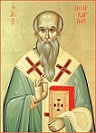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이상했다. 그 멜로디는 침침한 지하상가의 탁한 공기마저 정화시키는 느낌이었다. 음반을 파는 작은 가게의 밖에 놓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그 노래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샀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거실 바닥에는 된장을 담았던 뚝배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아내가 가출을 했다. 우리는 서로 극도로 예민해져서 부딪치고 파란 불꽃을 튕겼다.
그 무렵 나는 사라지는 꿈을 보면서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사법 고시에 합격을 하고 판검사가 되고 정계로 가서 한없이 높이 날아오르고 싶었다. 나를 무시하던 인간들을 짓밟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날아오르기는커녕 마음이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다. 고시 낭인으로 자유롭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부러웠다.
나는 먹고살기 위해 군 하급장교 제복 속에 갇혀있었다. 이미 아내와 딸이 있고 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장이었다. 고시에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다. 공허했다. 나는 빈 아파트에서 사온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잔잔한 감동이 삭막한 방에 너울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가사는 나의 영혼을 흔들고 있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송수화기를 타고 아내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아내와 화해를 했다. 밤이면 나의 방을 그 가수가 부른 찬송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고시 공부의 마지막 행진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시험장에 가고 싶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고 공부했다.
어느 날 깊은 밤이었다. 열려 있는 창을 통해 별이 총총하게 떠 있는 게 보였다. 누구에겐가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떠올랐다.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있다는 그분에게 기도했다.
딱 한 번만 붙여달라고 사정했다. 야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했다. 개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쭈그러진 깡통같이 일그러지는 게 겁이 나서 그런다고 고백했다. 합격만 시켜주면 판검사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탄 수레를 끌어도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겠다고 맹세했다.
순간 비로서 나는 깨달았다. 욕망을 능력의 한계 내에서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해에 나는 합격했다. 성적도 최상위권이었다.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 기도를 우연히 들은 그분이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그해 합격자 명단에서 홍준표도 추미애도 봤다.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힘든 터널을 지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갔다.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은 내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았다. 어떤 때 그곳은 정치단체였다. 영혼의 병을 고치러 갔는데 그 안에도 좌우파로 갈리어 싸우고 있었다. 정치적 시위에 도 참석하라고 했다.
교회는 어떤 때는 사회개혁이나 자선단체였다. 성경 속의 바울은 전도자였지 개혁가는 아닌 것 같아 보였다. 사람을 가장 위에 놓고 그분의 진리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 이런저런 의식이 많고 믿음을 철학적 원리로 해석하려고 하기도 했다.
성직자나 신도마다 관점과 믿음의 깊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았다. 나는 주로 신약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거기에 무리한 주해를 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에 조화시키는 게 기독교이고 교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뒷골목 개인 법률 사무실에서 칠십 고개에 다다를 때까지 평생을 변호사로 책을 읽고 작은 글을 쓰면서 조용히 살아왔다.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 다른 것 같다.
젊은 날 합격발표장에서 이름을 보았던 홍준표나 추미애 같은 분들은 판검사를 거치고 장관과 의원을 거쳐 대통령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다. 인생의 역전드라마이고 성공 케이스였다. 마지막 영광의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경쟁자를 향해 화를 뿜어내기도 했다.
나는 인생을 돌이켜 본다. 이십 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하는 날 운명이 바뀐 것 같다. 그날 내게 그분이 들어왔다. 마음이 바뀌었다. 구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많아지게 됐다. 분노보다 잔잔한 기쁨이 크다.
이만하면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나는 청년들에게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분을 초청하라고 권하고 싶다. 〠
엄상익|변호사, 본지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