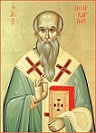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평일 오전 11시 제천 사랑의 교회 기도원 입구는 계곡의 냇물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다. 나는 성경이 든 배낭을 메고 순례자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언덕 위로 올라갔다. 아내가 뒤따르고 있었다.
세월의 물결에 떠밀리기 전에 버팀기둥이 될 예수를 좀 더 꽉 잡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든다. 성령을 구해도 항상 가슴속은 메마른 강바닥이었다. 생명수가 흐르지를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만 글자를 쫓아갈 뿐 그 속에 담긴 감동이 전해지지를 않는다. 나는 책을 앞에 놓고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였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단단히 부탁하러 가는 길이다. 언덕 중간에 빨간 지붕에 흰 벽의 아담한 건물이 나왔다. 일층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기도하러 온 사람이 우리 부부만인 것 같았다. ‘위이잉’하고 뒤쪽에서 그라인더의 기계음이 이따금 들릴 뿐이었다. 다른 일을 하러 간 것 같았다. 정오예배에 참석했다. 텅 빈 예배당에 젊은 목사 한 분이 조그만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신도는 우리 부부뿐이었다. 젊은 목사는 기타로 반주를 하며 찬송하고 차분하게 설교를 했다. 그를 보면서 몇 년 전 본 일본인 목사가 떠올랐다. 크리스찬이 적은 일본에서 그는 조그만 빌딩의 귀퉁이를 빌려 작은 교회를 차렸다. 일을 해서 임대료를 내며 7년을 버티는 동안 신도는 딱 한 명 그 동네 노숙자였다. 끄덕끄덕 졸다가 옆으로 쓰러지는 한 명의 신도를 보면서 그 일본인 목사는 하나님께 계속 교회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했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반 가량을 가면 육도라는 아주 조그만 섬이 나온다. 열여덟 명 가량의 주민이 농사를 짓고 사는 마을이다.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내려갈 무렵 그 섬마을 예배당에 들어갔었다. 단정하게 양복을 입은 노 목사가 동네 노인 세 명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다. 목자에게 한 마리의 양이 아흔아홉 마리보다 귀할 수 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원을 둘러볼 때였다. 검은 얼굴에 키가 껑충한 한 남자가 칡넝쿨을 끌고 가고 있었다. 특별새벽기도에 쓸 가시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그의 작업실을 들어가 봤다. 바닥과 벽에 십자가들이 군대같이 꽉 차 있었다. 근처 산에 버려진 나뭇가지 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크고 작은 그 십자가들이 모두 살아서 말을 하는 것 같았다. 허리를 비틀고 ‘난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하면서 괴로워하는 십자가도 있었다. 작은 십자가 열두 개가 한 나무둥치 위에 나란히 꽂혀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고 했다. 기도원의 남자는 칡넝쿨로 사람 덩치만한 가시나무 십자가를 묶으면서 중얼거렸다. “가시나무로 만드니까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몰라, 이제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성령이 그를 통해 십자가를 만드는 것 같았다. 밤늦은 적막한 기도원의 한쪽에서는 남몰래 내려온 당회장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득한 서초동 네거리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두 아이를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오는 젊은 엄마도 보였다. 거대한 예배당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벽 쪽에 붉은 피를 흘리는 가시나무 십자가 두 개가 보였다. 엊그저께 신들린 듯한 그 남자가 수없이 찔리면서 만든 그 십자가였다. 손가락으로 흘러내리는 하얀 눈물을 닦으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었다. 기도원에 혼자 내려와 말씀을 달라고 고뇌하며 기도했을 것 같은 당회장 목사님이었다. 아름다운 특별새벽기도의 모임이다.〠 엄상익|변호사, 크리스찬리뷰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