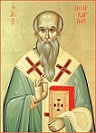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30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여러 삶의 모습들을 보았다. 며칠 전 장관을 하던 대학후배가 찾아왔다. 함께 사무실 근처 식당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식당에도 차 안에서도 상석이 있기 마련이었다.
“엄 변호사님이 선배니까 이제는 상석에 앉아야 하는 게 아닌가?” 장관은 인사말을 하며 상석에 가 앉았다. 그가 내게 하소연했다. “사람들이 지금도 모두 장관이라고 불러주면서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돈이 없다니까요. 장관이면 연금이라도 타는 줄 아나 봐요.” 장관을 마친 그는 시골에 가서 고구마농사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잠시 입었던 옷인 장관 직책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인상이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도 장관이 두 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채근담을 읽으면 벼슬은 잠시 입는 옷이라고 비유했다. 사람들이 몸통이 아니라 그 옷을 보고 허리를 굽힌다는 것이다. 또 누더기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보고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든지 개의치 말고 건강한 몸통을 만들라고 했다. 요즈음은 아주 부자였던 선배와 자주 바둑을 둔다. 부모 때부터 여유있던 선배는 제주도에 요트와 말이 네 필이나 있었다. 네 명의 운전기사가 그를 모셨다. 신문사까지 경영했다. 그러나 그의 엄청나던 재산이 한 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고 그는 몇 달간의 복역 후 욥 같은 인생이 됐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그는 지금 80 가까운 노인이 됐다. 갑자기 아파서 입원했는데 치료비도 없었다. 노부부 둘이서 사는 변두리의 아파트도 세를 사는 집이었다. 며칠 전 그와 동네기원에서 바둑을 둘 때였다. 그가 한탄같이 이렇게 말했다. “손자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요구하면 뭐든지 해주는 사람이야’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그런데 이젠 손자를 만나도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줄 수가 없는 신세가 됐어.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벌어먹어야 할 처지가 됐고 말이야. 참 한심한 인생이야.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부자일 때 좋은 일을 못해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안 그럴텐데 말이야.” 그의 뼈저린 진정한 후회였다. 바둑을 둔 후 우리는 가장 싼 주먹밥을 사서 나누어 먹었다. 성경은 부(富)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다. 반면에 더러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내가 다니는 동네 지압원장이 얼마 전 죽은 단골할머니 고객의 얘기를 이렇게 했다. “젊어 고생하며 번 돈으로 조그만 시골 땅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시에서 그 땅을 유명한 음악가의 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보상금을 받았어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이었지요. 그런 돈이 생기면 대부분 벌벌 떨면서 못쓰거나 자식들한테 빼앗기는데 이 할머니는 달라요. 며느리와 살기가 아무래도 불편했는지 따로 집을 얻어 나가신 후 파출부를 두 명이나 뒀어요. 월급을 후하게 주니까 파출부가 얼마나 정성으로 모셨는지 몰라요. 손자들이 올 때마다 정확히 100만 원씩 주셨어요. 물론 며느리나 아들딸한테도 섭섭지 않게 줬지요. 그러니 자식과 손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할머니한테 자주 드나들었어요. 한번은 아프셨는데 큰 병원 VIP실을 빌리셨어요. 어디 다닐 때가 있으시면 비싼 모범택시를 불러 타시더라구요. 주변사람한테도 후하게 돈을 쓰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아직 얼마간 돈이 남아 있더래요.” 지혜로운 노인이었다. 돈도 자기가 쓴 만큼이 진짜 번 게 아닐까. 삶에서 젊음도 직책도 돈도 결국에는 모두 소멸하는 과정이다. 인생은 체념과 포기의 연속이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서 가슴 속에 천국을 담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엄상익|변호사, 크리스찬리뷰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