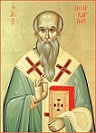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외무차관을 지낸 친구 M과 저녁을 함께 했다. 환갑이 넘은 우리는 이제는 서로 벽을 허물고 지난날의 인생을 한번 정산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땅 끝 마을 돈 없는 집안에서 자라나 일류 대학을 못가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외무고시공부를 했잖아? 고향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난 것으로 취급해줬지. 그런데 막상 외무부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런 찬밥신세가 없어요. 집안 좋은 일류대 정외과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데 나는 개밥에 도토리인 거야. 도대체 과장이 내게 일을 주지 않는 거야. 매일 내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서류복사였어. 외교관이란 꿈이 실현됐는데 나는 복사기 앞에서 하루를 보냈지.” 다들 그런 세월이 있기 마련이다. 그가 계속했다. “차라리 서류복사라도 잘하자 하는 마음을 먹었어. 복사만 하니까 도사가 되더라구. 서류를 복사하고 스테이플로 찍는데도 완벽한 기능공이 됐어. 한번 탁 찍으면 정확히 서류 귀에서 가로 세로 몇 미리까지 정확히 침이 박히는 거지. 그리고 서류를 만지는 사람이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뒷면의 침이 박힌 부분들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들었지.” 갑자기 그가 다시 보였다. 일본 전국시대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겨울 추운 날 상관이 나올 때까지 윗분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 따뜻하게 하던 일화가 떠올랐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었다. 그가 고생담을 계속했다. “일을 안주니까 그 다음은 과의 캐비닛에 막 쌓여있는 서류들 정리해 보기로 마음먹었어. 캐비넷에 몇십 년 동안 처리한 서류들이 그냥 수북이 쌓여 있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분류하고 깨끗하게 편철해서 바인더로 만들었지. 그러다 보니 예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꿰뚫게 되더라구. 과에 어떤 일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당황할 때가 있어. 그때 내가 관계된 서류들을 얼른 찾아다 줬지. 외무부 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전에 만들었던 서류에 내용만 약간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지. 그제서야 과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나에게 마음을 조금 여는 거야.” 어느 사회나 아웃사이더가 본 흐름에 끼어들기는 쉽지않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과의 공무원들과 함께 회식을 할 때였어.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과장이 다른 직원에게 ‘그 친구 사람은 괜찮은데 고향도 그렇고 대학이 그래서 말이야’라고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 아무리 겉으로는 평등하지만 일류대를 나오고 고향을 중심으로 한 치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기란 불가능한 현실이었지. 어느 날 담당 국장이 나를 보고 아예 외무부에 들어왔다고 아무나 국장이 되고 대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확인까지 시켜 주더라구.” 그는 외교관들이 기피하는 통상 일을 자청해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소고기 협상대표가 되어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미국산 소고기만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해서 백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왔을 때 그는 친일파 매국노가 되어 그의 인형이 여러 번 화형식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가난한 엄마도 공부하는 아들에게 소고기국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봉의 샐러리맨도 퇴근 후면 동료들과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를 먹는 행복을 가질 수 있어야 좋은 나라라고 했다. 그가 마지막에 내게 이렇게 혼자 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 앞에서는 웃는 아버지를 했어. 그리고 혼자 큰 수건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입속에 꽉 쳐 박는 거야. 그리고 벽을 보면서 아악하면서 절규했어.” 그가 나온 대학에서 처음으로 그는 차관이 됐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신다.〠 엄상익|변호사, 크리스찬리뷰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