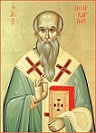|
나는 ‘다석일지’를 서점에서 구입해 보았다. 재미가 없었다. 공감도 되지 않고 흥미가 가지를 않았다. 가슴이 시원하게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왜 이해가 가지 않나 고민했다.
막연히 용량 부족인 나의 머리로 그 차원 높은 노인의 복잡한 회로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극히 일부분 내가 간신히 이해되는 구절들만 공책에 적어 두었다.
나는 이십 대에 세상 행운이 아닌 다른 보석 같은 행운을 맞이했으면서도 그걸 다 놓쳐버렸다. 스물세 살 무렵 해인사의 한 암자에 묵고 있었다. 고시 공부를 한다는 명분이었다.
어느 날 암자 주지 스님의 방에 들어갔더니 윗목에 인상이 고약한 중이 한 명 앉아있었다. 그가 쏘아 보내는 눈길 속에는 경멸감이 들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느꼈었다. 나는 지지 않고 되받아 그를 노려보았다. 눈길과 눈길 속에서 그 경멸감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느껴졌다. 그는 세속적인 출세만 머릿속에 가득한 나같은 존재를 벌레 보듯 하는 것 같았다.
아직 어렸던 나는 헐벗고 굶주리면서 추상적인 관념에 잡혀 그는 추상이 되어버렸다고 인식했다. 불쾌했던 나는 그 방을 나와버렸다.
그 스님이 법정 스님이었다. 내가 묵던 암자의 바로 아래 암자에 성철 스님이 있었다. 그분을 만나려면 삼천 배를 해야 만나준다고 했다. 그 의미를 몰랐던 나는 속으로 미쳤냐 삼천 배를 하게?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다.
되돌아 보면 돼지가 진주의 형태를 볼 수 있어도 그 효용과 의미를 모르는 것과 흡사하다고나 할까 그런 것이었다. 강원도 서석에 있는 작은 절에 있을 때였다. 옆방에는 잠시 그 절을 찾아온 스님이 묵고 있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촛불이 켜진 그 방을 보면 그 스님이 요가를 하는지 별 기괴한 모습이 장지문에 그림자로 나타났다. 참 별난 짓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안개가 숲에 물같이 흐를 때 그 스님은 나보고 산책을 같이 가자고 했다. 그 스님은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 스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중국의 민화 속에 나오는 마음 좋아 보이는 배뚱뚱이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분이 불교계에서 존경받는다는 탄허 스님이었다. 한마디라도 들어 두었다면 일평생 가슴에 간직할 귀한 보물일 텐데 나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이를 먹고 오십 대쯤이었다. 기독교계의 도인이라고 불리던 김흥호 박사가 나이 구십 노인일 때 찾아가 여러 달 강의를 들었다. 동양철학과 불경 그리고 성경을 꿰뚫은 분이라고 했다. 광복 다음 해인 천구백사십육년 김흥호 박사는 대학 선배인 이광수를 찾아가 동양사상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다.
이광수는 그 자리에서 “동양사상을 배우고 싶다면 류영모 선생에게 배우시오. 그분은 시계처럼 정확한 분인데 동양사상의 대가입니다.”라고 했다.
기독교계의 선구자인 김교신 선생은 다석 선생의 성경 풀이는 아주 높은 차원에서 보고 하는 말씀이라 그걸 알아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뜻을 깨닫기 어려우니 마음에 간직하고 오랫동안 되새겨 보라고 했다.
김흥호 박사는 이화여대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교재로 ‘사생’이라는 개인 월간지를 144호까지 냈다. 그 마지막 호에 ‘끊음’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이렇게 정의했다.
“주체적 진리를 도(道)라고 한다. 도란 별것 아니고 끊는 것이다. 세상을 끊고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도다. 도는 단(斷)이다. 보이지 않는 칼날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열리는 세계가 실재의 세계다. 나를 끊는다는 것은 탐 진 치 삼독의 수욕을 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화여대의 컴컴한 지하실에서 돌아가시기 전 그 노인의 마지막 강의들을 들었다. 기독계 목사 사이에서 거물로 존경받는 엄두섭 목사를 돌아가시기 얼마 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수도원을 만들어 영성 생활을 이끌었던 분이다.
아흔 살이 넘은 그분은 자리에 누워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나를 맞이 했었다. 자신이 깨달은 여러 말을 했지만 용량부족인 나는 이해가 힘들었다.
다만 이런 말이 기억이 난다.
“나는 평생 일 선(善)도 못했어요. 지나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해왔던 설교도 그리고 일도 모두 위선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 이세종 같은 사람이 진짜 도인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거지 같아 보였죠. 산에서 쑥을 뜯어 먹고 살았어요.”
이세종은 구한말 머슴 출신이었다. 이웃에서 구한 신약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광원이라는 믿음의 단체가 시작됐다고 한다.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힌 나는 내 앞으로 다가온 진리들을 보지 못했었다. 이해도 공감도 할 수 없었다. 나이먹은 지금도 그렇다. 그저 내 그릇에 맞을 정도만 받아들이고 내 눈 높이만큼만 이해한다.
젊어서 재미없다고 하면서 마음 속으로 그분들에게 투정을 부리던 때를 반성한다.〠
엄상익|변호사, 본지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